페이지 정보
- 저자/책명
- 정선우/내 이야기가 진담이 될까 봐
- 출판사/년도
- 파란/2025. 9. 10.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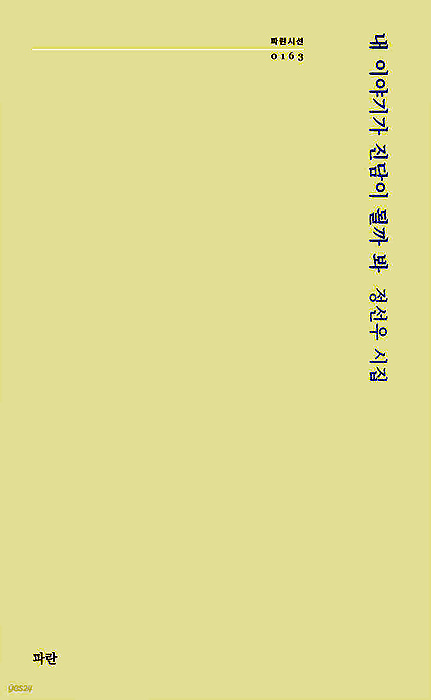
책 소개
너는, 그리고 온다 긴 복도처럼, 오로지 비처럼, 기척도 없이 간결하게
[내 이야기가 진담이 될까 봐]는 정선우 시인의 두 번째 신작 시집으로, 「안개와 너와 너의 안개」 「폭설」 「서쪽 물가 흰 모래밭입니다」 등 52편이 실려 있다.
정선우 시인은 2015년 [시와 사람]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모두의 모과들] [내 이야기가 진담이 될까 봐]를 썼다.
정선우 시인은 스스로가 공백임을 안다. ‘나’를 포함하여, ‘당신’과 이 세계 또한 ‘공백’임을. 그러나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이미지들이다. “유리 조각이 나를 통과”하듯이(「아무도 이름 부르지 않았다」), 이미지들은 시인의 감각을 일깨운다. 그 감각의 일생 끝에 시인은 “뼈대만 남은 울음”을 마주한다(「몇 개의 표정」). “섬세한 취향에 골몰”하며 “엔딩의 예감을 배경으로” “생각이 뾰족한 지붕 끝을 더듬어 보”기도 한다(「내향적인 방」). 사유(“생각”)의 “뾰족한 지붕” 끝에는 이 세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그 공백을 시인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정동하는(affecting) 것은 다르다. 이미지들에 감금된 신체로 파고드는 공백의 정동은 ‘에고 살해’를 넘어서 ‘너’의 살해와 세계의 살해로 이어진다. 시인의 사유는 그 모든 것에 기입된 공백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동을 마주하는 중이다.
시인은 이미 알고 있다. “거울 속 의자의 저 여인”이 “나를 훔쳐 입은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흰색 교향곡 2번」). 그 모든 서사의 결여를. “거울 밖이 파지보다, 폐기될” 이 세계의 “이야기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을(「정선우」). 모든 서사의 바깥이 이 세계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놀라워라. 그럼에도 ‘나’는 날마다 “우후죽순 눅눅한” 채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깡」). 하여, 시인은 울음을 견디면서 사력을 다해 자신의 ‘그림자’를 “반에서 반으로 줄”이려 애를 쓰고 있다(「버리고 있다」). 스스로 공백이 되는 과정을 견뎌 내는 것이 정선우의 시다. (이상 박대현 문학평론가의 해설 중에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52132721>

